정부 “가처분은 원고로 한정해야”…인용시 28개 주는 출생시민권 금지 시행
연방대법원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를 두고 심리를 개시했다.
이날 워싱턴DC의 대법원에서 진행된 심리는 일개 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시행을 미국 전역에서 막을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그간 정책을 뒤집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효력 중지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데,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출생시민권 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하급심 결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 결정 하나로 미국 전역에서 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관들이 단 한 명의 판사가 행정부 정책을 전국에서 금지할 권력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행정명령 자체의 합헌성과 여파를 걱정하는 듯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그간 대법관들이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심리에서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연방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이 전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뤄졌으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공화당 주들이 연방 정책을 막으려고 텍사스로 갔다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자기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가처분 결정을 얻어내 상대 정당의 정책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대법원이 분열돼 보였으며 2시간 넘게 진행된 구두심리 이후에도 대법원이 이 사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100년 넘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내가 보기에 이 행정명령은 4건의 판례를 위반한다”고 말하고서는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제한하면 수백, 수천 개의 개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금지에 반대하는 원고들이 개별 소송 대신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와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이런 주장에 열린 태도를 보였다고 WP는 보도했다.
이처럼 이날 심리가 하급심 효력의 범위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직접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제한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하지 않은 나머지 28개 주와 미국 영토에서 출생시민권을 바로 금지하기 시작할 수 있다.
대법원이 전국 단위의 효력을 인정하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위헌 여부는 하급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시 대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NYT는 대법원이 6월 후반이나 7월 초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라 더 빨리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출생시민권은 본질적으로 헌법 14조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다.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국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부분 법학자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미국에서 체포, 기소돼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WP는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전 판례도 외국 외교관 자녀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 사람의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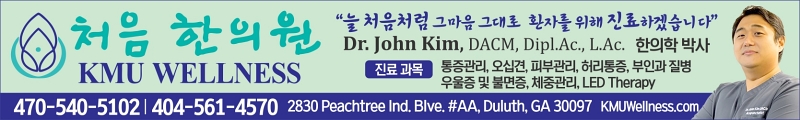


![임신부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shutterstock_2459409395-350x250.jpg)

![11일 텍사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 앞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2025-07-11T135412Z_802527132_RC2DKFASCSQ6_RTRMADP_3_USA-WEATHER-TEXAS-TRUMP_800-350x250.jpg)

![지난 27일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기도하고 있다. [로이터]](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6/대법-판결_800-350x250.jpg)


![ICE 요원 이미지 사진. [출처 Rabanser / Shutterstock.com]](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5/shutterstock_2154227131-75x75.jpg)

![육류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5/shutterstock_2450875827-75x75.jpg)
![타운하우스 단지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shutterstock_2477836445-350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