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지아조(堅持雅操)’는 곧고 바른 지조와 절개를 굳게 지킨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고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서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섣불리 지조를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말이다. 정신의 자존자시(自尊自恃)를 위해서는 자학과도 같은 생활을 견디는 힘이 없이는 지조는 지켜지지 않는다. 신채호 선생이 망명 생활 중 추운 겨울에 세수를 하는데 꼿꼿이 서서 두 손으로 물을 움켜다 얼굴을 씻기 때문에 찬물이 모두 소매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제자가 그 까닭을 묻자, 내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 머리 숙일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바라는 지조는 이토록 삼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들 뒤에는 당신들을 주시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위의(威儀)와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좀 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라는 충고 정도다.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만고의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채근담의 구절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란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딜 힘도 없으면서 뜻있는 야당의 투사를 가장함으로써 권력의 미끼를 기다리다가 후딱 넘어가는 교지를 버리라는 말이다. 욕인으로 출세의 바탕을 삼고 항거로써 최대의 아첨을 일삼는 본색을 탄로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충고의 근원을 캐면 그 바닥에는 변절하지 마라, 지조의 힘을 기르란 뜻이 깃들어 있다.
조지훈 선생이 1960년 이 글을 쓰면서 ‘선비나 교양인의, 지도자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던 지조나 ‘백주대로에 돌아앉아 볼기짝을 까고 대변을 보는 격’이라며 개탄한 변절의 의미는 지금도 유효하다. 오히려 그때보다 오늘에 더욱 빛을 발하는 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조지훈의 ‘지조론’은 자유당 말기의 극도로 혼란하고 부패한 정치 현실 속에서 과거의 친일파들이 과거에 대한 뉘우침 없이 정치 일선에서 행세를 하고, 정치 지도자들마저 어떤 신념이나 지조도 없이 시대상황에 따라 변절을 일삼는 세태를 냉철한 지성으로 비판한 글이다. 1960년 초 나라가 혼미했던 시절, ‘선비’의 뜻을 꺾고 정권에 아부했던 지도자들에게, 후세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나설 지도자들을 향해 던진 선생의 질타는 지금도 유효하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다. 자기의 명리(名利)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一朝)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조지훈의 지조는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지조 유무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마땅히 지조를 갖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하고 개인의 명리와 잇속을 차리는 자는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호통친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지조를 소중히 여겼다. 지조를 지키고자 선비들은 목숨을 가볍게 보았고, 관리들은 관직을 내던졌고, 백성들은 염치를 지켰다. 그러면 현대사회에도 지조가 필요한가. 시인은 그렇다고 말한다. 조지훈의 ‘지조론’은 문체가 단아하고 내용이 풍부하고 의미가 깊으니, 아직 이보다 나은 글을 보지 못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조란 순수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신이요, 고귀한 투쟁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지조를 본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 없다.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하루아침에 동지를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자의 무절제와 배신은 변절의 전형이다.’
우리는 일찍이 어떤 선비도 변절하여 권력에 영합해서 들어갔다가 더러운 물을 뒤집어쓰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온 예를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연산주(燕山主)의 황음(荒淫)에 어떤 고관의 부인이 궁중에 불리어 갈 때 온몸을 명주로 동여매고 들어가면서, 만일 욕을 보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 놓고 밀실에 들어가서는 그 황홀한 장치와 향기에 취하여 제 손으로 명주를 풀고 눕더라는 야담이 있다. 어떤 강간도 나중에는 화간(和姦)이 된다는 이치와 같지 않는가. 우리가 지조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은 다음의 한 구절이다. ‘기녀(妓女)라도 그늘막에 남편을 좇으면 한평생 분냄새가 거리낌 없을 것이요, 정부(貞婦)라도 머리털 센 다음에 정조를 잃고 보면 반생의 깨끗한 고절(苦節)이 아랑곳 없으리라.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을 보려면 다만 그 후반을 보라‘ 하였으니 참으로 명언이다.
늦바람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아직 지조를 깨뜨린 적이 없는 이는 만년을 더욱 힘 쓸 것이니 사람이란 늙으면 더러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직 철이 안 든 탓으로 바람이 났던 이들은 스스로의 후반을 위하여 번연히 깨우치라. 역사에 남은 것은 그분들의 후반이요, 따라서 그분들의 생명은 마지막에 길이 남게 된다.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권력에 뒤늦게 팔리는 행색은 딱하기 짝없다. 배고프고 욕된 것을 조금 더 참으라. 그보다 더한 욕이 변절 뒤에 기다리고 있다. 6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조지훈 선생의 ’지조론‘이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슬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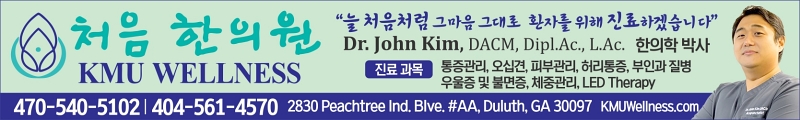

![설산, 2008, 캔버스에 아크릴. [사진 High Museum of Art]](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설악산-2-75x75.jpg)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shutterstock_1818480278-75x75.jpg)
![실반 힐스 아파트 단지 조감도. [애틀랜타 주택청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실반-힐스-조감도_800-75x7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