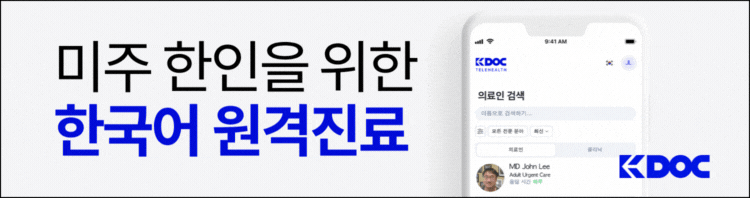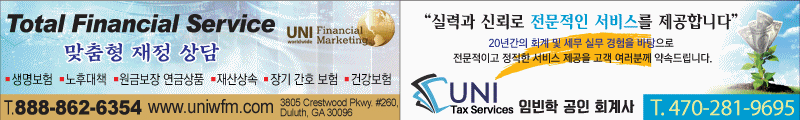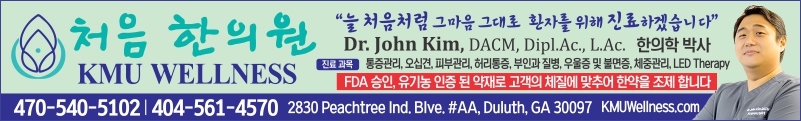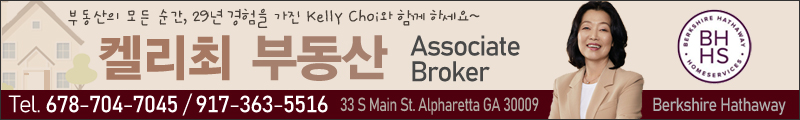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발명가, 출판업자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처럼 세금은 삶의 필수 요소이며, 심지어 죽은 뒤에도 세금은 따라붙는다. 우리가 과자 한 봉지를 사더라도 세금이 붙는 것을 보면, 세금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무다.
‘소시열’ 씨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다. 첫 직장을 구하고 처음 받은 봉급명세서를 살펴보던 그는, 총 급여의 7.65%가 소셜 시큐리티 세금 명목으로 공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는다. “이게 항상 일정한 세율인가요?” 동료에게 묻자, 그 역시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누구나 동일할 것이라고 답한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이우집’ 씨와 담소를 나누던 중,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세율이 15.3%나 되니, 버는 돈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다”고 불평하는 ‘이우집’ 씨의 말에, ‘소시열’ 씨는 혼란스럽다. 자신은 분명 7.65%만 냈는데, 왜 ‘이우집’ 씨는 두 배나 되는 세율을 내고 있는 걸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소시열’ 씨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를 찾아간다. 회계 담당자는 “소 선생님은 회사원이시니까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고, ‘이우집’ 씨는 아마 자영업을 하셔서 전체 세금을 본인이 다 부담하시는 걸 겁니다”라고 설명한다. 즉, 회사원이면 7.65%만 내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고용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는 소득의 15.3%를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합산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보면 12.4%는 소셜 시큐리티, 2.9%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본인이 6.2%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1.45%의 메디케어 세금을 내며,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여 국세청(IRS)에 납부하게 된다. 즉, 회사원이 내는 총 세율도 15.3%이지만,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개인 입장에선 7.65%만 체감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근로 소득(Earned Income)’에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근로 소득이란 급여, 수당, 보너스, 팁, 자영업 순이익 등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한다. 반면, 렌트 수입이나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수익, 이자소득, 퇴직연금 등은 근로 소득이 아니므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 소득이나 투자 수익만 있는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낼 의무가 없고, 그 결과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도 쌓을 수 없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40 크레딧, 즉 약 10년간의 근로)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회계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해 일정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내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단순한 공제가 아니라 노후를 위한 일종의 투자다. 구조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준비한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