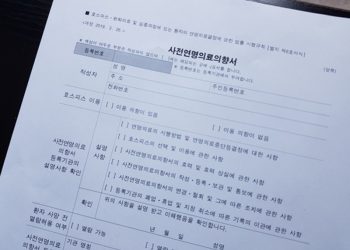목사지만 이젠 불신자 죽음도 축복
90대 한인 이혼 부부가 임종을 앞두고 서로를 찾았다. 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이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밤새 주고받았다. “’10년 더 살겠다’, ‘돈 더 벌겠다’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살다가 생긴 말 못할 응어리를 푸는 게 죽음을 앞둔 환자의 지상 과제입니다.” 80여명 환자를 둔 조지아주 둘루스 미선 호스피스의 채플린(병원·군·교도소 등에서 일하는 목사)을 맡고 있는 티모시 조(한국명 조연형) 목사(60)를 21일 만났다. 그는 “27년의 목회 활동에선 듣지 못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근 2년 동안 듣고 있다”며 “새삼 꺼내기 어려웠던 환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고 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기대여명이 6개월 남짓 남은 임종기 환자가 호스피스 대상자다. 질병의 완치보다 통증 완화에 더 중점을 둔다. 이 때문에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편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호스피스의 진짜 목적은 환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가장 흔한 형태는 간호사·사회복지사·채플린 등으로 꾸려진 호스피스 팀이 매주 가정을 방문, 환자를 돌보는 방식이다.
조 목사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환자를 찾는다. 2~3년을 넘겨 생존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다. 노스사이드 병원에서 2년의 채플린 과정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1년 펠로우십(세부전공)으로 완화의료를 공부한 뒤 노스사이드 둘루스·로렌스빌 병동에서 처음 일했다. 주된 업무는 환자의 심리·정서 지원으로, 환자 종교에 따라 스님, 신부, 무슬림 지도자 등에게 연락해 대신 임종 기도를 부탁하기도 한다. 그는 “살다보면 후회가 생기기 마련인데, 죽기 전 목적 없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며 “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도 죽음 앞에서 인내심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편안한 죽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미움이다. 특히 가까운 이들에 대한 미움이 그렇다. “57세 남성이 심장 개복 수술을 앞두고 나를 찾았다. 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쓰리잡’까지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도리어 딸들이 성장기 아빠의 빈자리를 탓하며 그를 증오했다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소원이 6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막내딸과 화해하는 것이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후회도 적지 않다. 한국, 타주 등 멀리서 쉽게 볼 수 없는 이들을 향한 그리움, 죄책감, 분노 등이 뒤섞여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낼 때도 많다.
‘죽으면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사람은 신앙인 중에도 드물다.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몸을 덜덜 떠는 분도 있다. 그럴 땐 두려운 이유를 여쭤본다. 대부분 자신의 두려움을 설명하다가 흥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채플린과 환자로 맺은 인연이 장례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조 목사는 고인이 생전 좋아했던 가요, 시 구절, 가족관계를 꼼꼼히 취재해 추도사에 녹인다. 채플린 역할의 확장이다. “지옥에 갈 불신자의 장례에서 목사가 진심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채플린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로 일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의사처럼 행동했지만, 이제는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환자의 필요와 생각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