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구글’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온라인에는 각종 건강 정보가 넘쳐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응급 상황이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는 여전히 전문 의사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애틀랜타 저널(AJC)는 최근 ‘챗GPT로 진단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챗GPT가 다양한 정보는 알려주지만 진단에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전했다.
뉴욕 빙햄턴대학의 아메드 압딘 하메드 연구팀은 최근 AI의 의료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과학 저널 아이사이언스(iScience)에 게재했다. 분석 결과, AI는 질병이나 약물, 유전자 관련 정보 제공에서는 88~97%에 달하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반면 모호하거나 일상적 표현으로 증상을 설명하면 진단 정확도는 크게 떨어졌다.
하메드 연구원은 “질병, 약, 유전자 같은 전문 용어는 잘 인식했지만, 사람들이 증상을 두리뭉실하게 묘사하면 AI가 이를 의학적 원인과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AI 진단의 문제점으로 “AI는 자신있게 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웰스타 병원그룹 소속 앤드류 손튼 박사는 그는 “챗GPT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도 마치 정확한 사실처럼 전달한다”며 “정확한 답변과 틀린 답변 모두 같은 확신으로 말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응급 상황이라면 인터넷 검색이나 AI 상담에 의존할 게 아니라 911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의료계는 챗GPT가 질병과 약물에 대한 일반적 지식 접근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튼 박사는 “AI를 환자 스스로 증상을 분석하고 진단을 내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젊은 세대일수록 AI 건강 상담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4%가 챗GPT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성인 17%, 그리고 30세 미만의 약 25%는 매달 한 번 이상 AI를 통해 건강 정보를 얻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웹페이지 방문 기록 25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93%가 AI 생성 콘텐츠에 접했고, 60%는 구글 검색으로 AI 요약 정보를 얻었다. 손튼 박사는 “요즘에는 환자들이 의사 앞에서 온라인에서 본 건강 정보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의료진도 환자가 인터넷을 검색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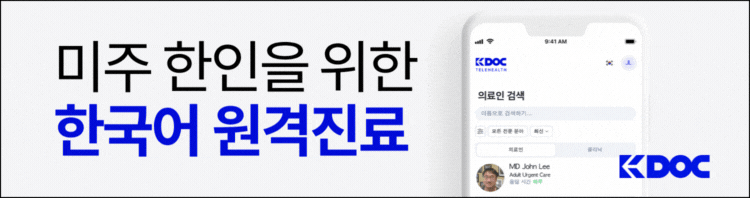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9/shutterstock_2237655785-750x5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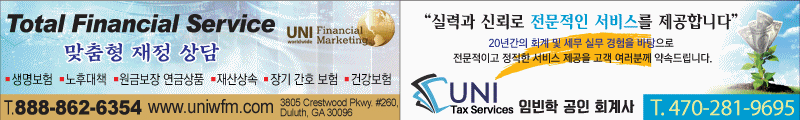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한 시간의 보너스 수면’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면에 건강 리스크가 숨어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0/shutterstock_2342280861-350x250.jpg)
![‘비타민K’를 강화한 건강보조제가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0/shutterstock_2504710649-350x250.jpg)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0/shutterstock_2370540011-350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