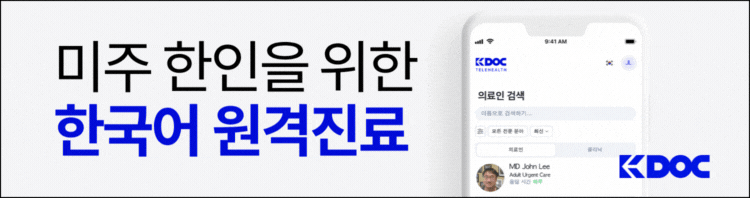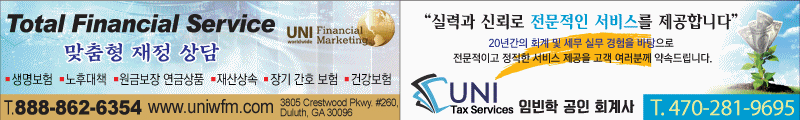1950-1970년대까지를 겪은 한인들은 ‘악수표 밀가루’를 기억할 것이다. 전쟁 후 가난하던 시절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미국과 적십자에서 빈민구제 목적으로 제공한 밀가루 포대, 피쉬오일 등을 무상 원조했다. 한국인들은 이 밀가루로 죽, 칼국수,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다. 미국이 기부한 소독약과 백신은 한국에서 전염병을 퇴치했다. 미군 구호물자에는 ‘미국 국민이 기증한다’며 ‘악수’하는 손이 그려져 있어 ‘악수표 밀가루’로 불렸다.
밀가루와 백신, 약을 무료로 보낸 곳은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였다. 그 결과 최빈국 한국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타국을 돕고 있다. 미국의 원조가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이다. “극빈층 감소, 산모·영아 사망률 절반 이하 감소, 여성 교육 참여율 급증, 이 모든 성과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2019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브히지트 바네르지(Banerjee Calls) MIT 교수는 지적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USAID를 “낭비와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난하고, 예산을 삭감해 기능을 정지시켰다. 미국을 따라 주요 서방국가들이 최빈국 원조를 축소하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아프리카 등 최빈국으로 운송될 예정이었던 조지아주 농가의 농산물은 창고에서 썩고, 조지아 농민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수많은 아동이 굶주림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바네르지 교수는 이에 대해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국제원조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정의한다. 최빈국 원조는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도덕적 토대라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국제 원조 중단은 재원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이 문제”라며 “전 세계 상위 3000명의 부호들이 재산의 단 1%만 기부해도 약 1400억 달러가 마련된다”고 지적한다.
바네르지 교수는 “국제 원조는 낭비와 부패”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기와 부패가 아니라 전달 방식과 불필요한 과잉 절차가 문제”라고 반박한다. 그는 “언론은 지나치게 국제원조의 실패, 부패, 재난에 집중한다”며 “긍정적인 성과를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결국 바네르지 교수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원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이 의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전염병, 난민 문제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미국만의 고립은 불가능하다. 연대만이 답이다.
원조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악수표 밀가루’를 받아먹던 수십년전 한국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USAID 폐지는 잘못된 조치이며, 최빈국 국제원조는 다시 부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