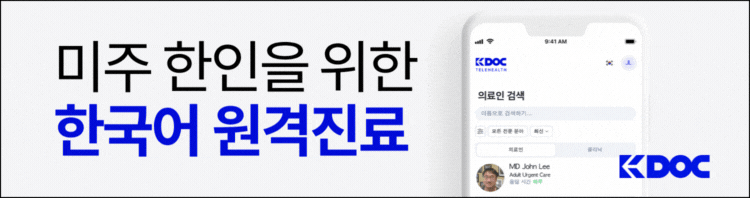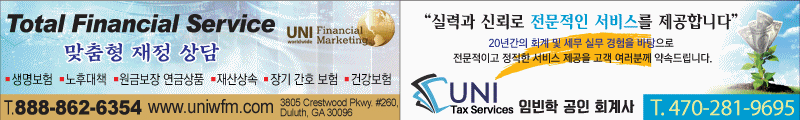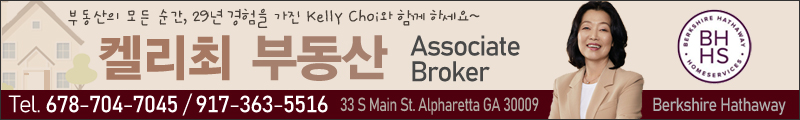6· 25전쟁이 일어났을 때나는 12살의 국민학교 6학년생이었다. 개전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중인데 북한의 야크 전투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나 한바탕 기총소사를 하고 돌아갔다. 아이들은 창문가에 몰려가 북한 전투기를 신기한 듯이 올려다보면서 소리쳤다. 6월 28일 새벽 한강 쪽에서 들려오는 번개 찬둥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나중에 그것이 한강 인도교 폭파 소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서울은 인민군에 점령되었다. 개전 3일만이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인공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앳된 얼굴의 인민군 병사가 탱크 위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울 거리에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인민군은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다. 우리 동네에 아이들과 잘 놀아주던 어른 한 분이 살았는데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되자 한동안 잠적했던 그가 장총을 든 인민군과 함께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다. 어른들은 그가 ‘지방 빨갱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의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때 ‘빨갱이’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동네 벽보판 지도에는 매일 인민군의 남진 루트가 붉은 화살표로 자랑스럽게 표시되었다. 어느 날 그 화살표는 낙동강에서 멈춰섰다..
“한 달 농성 끝에 나와 보는 다부원은/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피아 공방의 화포가/한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아아 다부원은 이렇게도/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나./조그만 마을 하나를/자유의 국토 안에 살리기 위해서는/한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제 목숨을 다 마치지 못했거니/사람들아 묻지를 말아라/이 황폐한 풍경이/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를…
조지훈 시인의 ‘다부원에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다부동 전투의 처절함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1950년 8월, 국군1사단은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서 인민군 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전쟁. 불과 사흘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했고, 마산-왜관-영덕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뚫기 위해 대구 축선을 공격했다. 그 중심이 대구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유학산과 팔공산 사이 큰 골짜기 다부동이다. 이곳이 무너지면 바로 대구와 부산까지 적군에게 내어 줄 상황이었다. 조국의 명운이 달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백선엽 사단장은 병사들에게 ”내가 선두에 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고 외치고는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이 전투의 결사항전은 전세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적군은 기세가 꺾였고 아군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냄으로써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연이은 폭격과 포격으로 건물은 모조리 부서지고 시내에는 시체가 나딩굴었다. 아현동 고개 마루턱 엄폐호 앞에서 새까맣게 타 죽은 인민군의 시체를 보았다. 끔찍했다. 화염방사기에 맞은 것이다. 1· 4 후퇴 때 우리 가족은 물밀 듯이 내려오는 피난민 대열에 끼여 피난길에 올랐다. 마포에서 꽁꽁 얼어붙은 한강을 도보로 건넜다. 한강 얼음 위로 보따리 짐을 잔뜩 실은 소달구지가 느릿느릿 건너갔다. 짐보따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와 뒤에서 수레를 미는 남자, 막내 업은 누이, 보따리를 지고 든 아이, 지친 사람들의 얼굴은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영등포역에서 피난열차에 올라탔다. 객차도 아니고 화물열차에 지붕까지 피난민들이 짐짝처럼 빽빽이 들어찼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파고 들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그때 살길을 찾아 떠나야 했던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현실이었다.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수복하면서 우리 가족은 영등포까지 올라왔지만, 한강에서 길이 막혔다. 아직 서을은 작전지역이었기 때문에 도강증이 없으면 한강을 넘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매일 자건거를 끌고 시골을 다니며 양식을 구해 오셨다. 시래기 죽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시절이었다. 가끔 어머니가 미군부대에서 먹다 버린 잔반을 모아 끓여주는 ‘꿀꿀이죽’은 아이들이 호사하는 날이었다. 지금은 돼지 사료로나 쓰일 음식이지만 그때는 없어서 못 먹던 최고급 영양식었다. 전쟁을 겪은 세대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때의 소년은 이제 백발노인이 되었다. 이 전쟁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우리 역사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신임 장교들은 유대광야 동쪽 끝에 우뚝 솟은 마사다 요새 정상에서 임관식을 하며 이렇게 맹세‘한다.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지 말라…마사다를 기억하라.“ 마사다는 로마군에 끝까지 항거하던 유대인들이 로마군의 공격이 임박하자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967명 전원이 자살한 곳으로 이스라엘내 560만명을 비롯해 전세계 2000만 유대인의 자존감의 상징이다. 마사다에서 군사 훈련, 애국심 교육 등을 진행하며, 마사다를 통해 유대인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역사를 잊지 않도록 교육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올해는 6·25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6· 25의 노래‘를 가만히 불러본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선생님의 반주에 따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목청껏 부르던 기억이 난다. 6·25는 아픈 기억이다. 또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