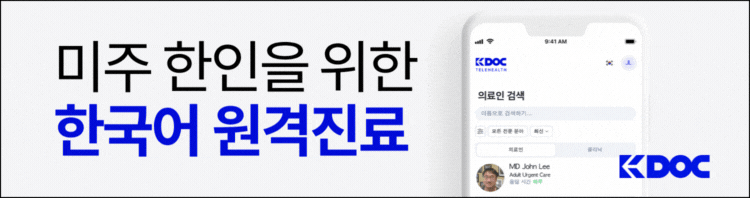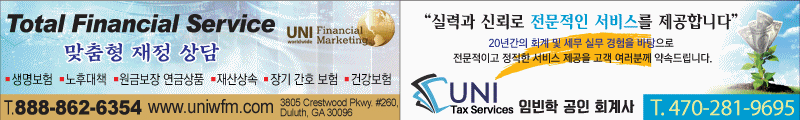책에 담긴 문장들과 그 문장들을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을 더해 내놓은 이야기는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생각지 못한 지점을 일깨워준다. 읽자마자 가슴에 꽂히고,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글, 청춘처럼 짧지만 아름다운 한 줄, 몇 번씩 혀로 감으며 밑줄을 긋는 문장은 심장에 남고 가슴을 뛰게 한다. 삶의 나침반이 되고 깨달음의 열쇠를 준다. 소리 없이 마음을 토닥여주는 한 줄의 글귀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삶의 지혜와 깊은 깨달음을 주어 미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감동도 선사한다.
<욕을 좀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남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자 강현식은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와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건넨다. 그의 조언은 한마디로 이렇다. “남들이 말하는 기준에 나를 꿰어맞추지 말라!” 우리가 하는 걱정과 고민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든 거기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려울 때,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을 때,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덧날 때, 내가 원하는 것처럼 관계가 풀리지 않아 우울할 때 등 삶의 최대 난제인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명쾌하고 속 시원한 조언을 해 준다. 이 책은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인간관계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포근한 위로를 전해주고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며 따스한 위로를 건네주는 책들은 세상에 넘친다. 그러나 위로만으로는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저 흠집 난 마음에 임시방편으로 반창고를 붙여두는 격이다. 진짜 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돌직구 같은 조언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짧지만 강렬한 조언을 통해 독자들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실에서 자꾸만 도망치려는 태도,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두려워 쉽게 인정해버리는 태도, 귀찮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태도를, 따듯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짚어주고 변화하기를 요구한다.
누구나 욕먹기를 싫어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누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런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남을 위해 억눌러 놓은 욕구는 결국 폭발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고 타인에게 다 맞춰준다 해도 욕먹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기 때문이다. 비난받는 건 두렵고 그렇다고 계속 가면을 쓰고 살기엔 너무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저자는 말한다. “까짓거 욕 좀 먹고 삽시다!”라고. 그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살자며,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숨기고 살면 너무 허망하지 않겠냐고 말한다. 저자의 솔직하고 당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담긴 글을 읽다 보면, 어느덧 평생을 무겁게 지고 다니던 문제들이 사르르 녹아버린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포장한 내 삶의 껍데기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 껍데기만을 보고 나 또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신뢰할만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혹은 존경할만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들은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영혼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한다. 내가 내 속에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굶주리는지, 얼마나 고통받는지,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다.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잘랄루딘 루니는 이렇게 말했다.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다./영혼이 그 풀밭에 누우면/세상은 더 없이 충만해 말이 필요없고/생각, 언어, 심지어 ‘서로’라는 단어조차/그저 무의미할 뿐.”
다음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회 주교의 무덤 앞에 적혀있는 묘비명이다. 아마 주교가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을 그대로 묘비명에 적어 놓았지 않았나 싶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세상을 탓하고 남 탓 하기 쉽지만,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게 답이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성공회 주교의 고백처럼 상대가 변하지 않으니까. 남 탓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인간 성정이다. 우리 속담에도 ‘잘되면 제 탓’, ‘안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다. 이기적 가치관 확대로 자성(自省)은 언어의 유희 정도로 치부되는 세태다.
읽자마자 가슴에 꽂히고,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글, 삶의 나침반이 되고 깨달음의 열쇠를 준다. 책을 읽다 보면 책 속 곳곳에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다. 책을 펴고 보물찾기 하듯 나만의 한 줄을 찾는다. 그리고 그 한 줄에 내 삶을 투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