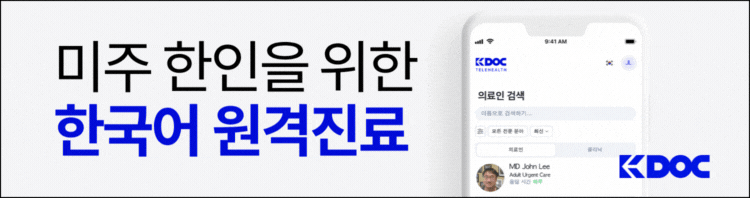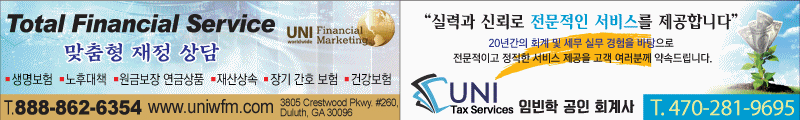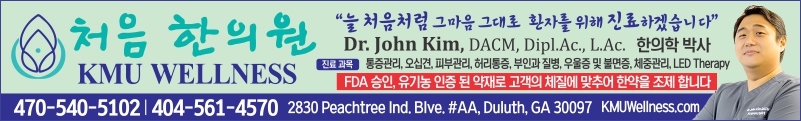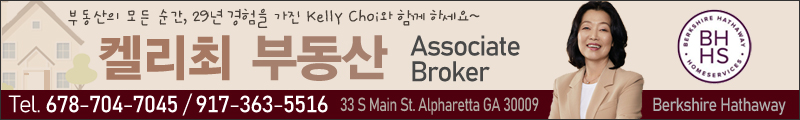영화 ‘일 포스티노’를 보았다. 197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출신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망명해서 이탈리아의 어느 섬에 머물렀을 때, 세계 각지에서 보내오는 편지를 그에게 전해주는 한 순박한 우편배달부와 나눈 우정을 그린 영화이다.
우편배달부 마리오는 그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에 차츰 눈을 떠간다. 그는 시인에게서 ‘비가 온다’를 ‘하늘이 운다’로 표현하는 것이 곧 시의 원리인 메타포(은유)라는 것을 배우면서 시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 네루다의 시 한 편이 소개된다. 네루다의 ‘시(詩)’라는 제목의 시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었다….시가/나를 찾아왔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시가 어디에서 왔는지, 겨울인지 강인지/ 시가 어떻게, 혹은 언제 왔는지 나는 모른다/시는 목소리도 없었고/또한 침묵도 없었다/그러나 어떤 거리에서 시가 나를 불렀다/밤의 어둠 속에서/갑자기 다른 것들에서/타오르는 화염 속에서/혹은 혼자서/혹은 혼자서 되돌아오는 길 속에서/그곳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도 존재하지 않았고/그래서 시가 나를 건드렸다.”
주인공 마리오는 백수다. 어부인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기엔 아무래도 적성도 소질도 없다. 하루는 영화를 보러갔는데 그 곳에서 네루다가 마리오의 시골 동네로 망명을 온다는 소식을 접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화관 옆 건물에는 우편배달부 구인 광고가 붙어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하라는 아버지의 충고가 떠올라 그는 우체국을 찾아간다. 공교롭게도 그 우편배달부의 일은 바로 그 영화관 뉴스에서 본 인기 시인 파블로 네루다에게 오는 편지만을 본인에게 배달하는 일이었다.
시골 청년과 스타 시인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마리오는 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전부 여성이라는 사실에 시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혹시 시를 쓰면 여자에게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인을 귀찮게하기 시작한다. 마침 마을의 주점에 마리오의 혼을 빼놓아버린 여성이 나타났다. 연애시의 대가에게 마리오는 묻는다. 어떻게 시인이 되었냐고. 그리고 대시인은 답한다.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주위를 감상해보게.”
시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냥 해변을 걸으라고 한다. 마리오는 도통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도 일단 해변을 걸어본다. 그리고 시인의 시를 읽으며 되뇐다. 하루는 편지를 배달하고 시인 앞에서 그의 시를 인용하며 멋진 말을 해본다. 시인은 자신 앞에서 ‘메타포(은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본인이 메타포의 대가이니 자신 앞에서 아는체 말라는 것일까. 그러나 마리오는 메타포가 뭔지도 모른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리숭한 단어의 뜻을 시인에게 묻고 설명을 듣는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말인 ‘은유.’ 마리오는 조금 더 해변을 걷기로 한다. 하루는 시인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려는 순간 떠오른 심상을 시로써 마리오에게 들려준다. 그 시를 들은 마리오는 대시인의 시가 이상하다고 대답한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해하는 시인에게 마리오가 말을 이어간다. “뭐라 할까. 단어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바다 위의 배가 단어들로 이리저리 튕기는 느낌이에요.” “방금 자네가 한 말이 뭔지 아나? 그게 은유야.” 그렇게 마리오는 시인이 되었다.
네루다는 “시가 날 찾아왔다”고 말한다. “어느 날 시가 날 찾아왔고 나는 그것이 내 순수한 심연의 한 부분임을 알았고, 마침내 내 내재성은 열려 있는 하늘 위에서 자유롭게 부서졌다.” 그에게 시는 이렇게 왔다. 인간도 이렇게 세상에 온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로. 시가 태어난 때와 자리는 아무도 모른다. 시는 그렇게 태어난다. 시는 아마 인류 역사가 시작 되었을 때부터 태어나지 않았을까. 불이 발견되기 전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에 아마 당시의 인류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와, 봄이다!”라고 외쳤을 것이다. 시인은 그 외침이 바로 시라고 한다. 그렇다. 시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햇살 가득한 대낮/지금 나하고 하고 싶어?/내가 물었을 때/꽃처럼 피어난/나의 문자/”응“/동그란 해로 너 내 위에 떠 있고/동그란 달로 나 네 아래 떠 있는/이 눈부신 언어의 체위/오직 심장으로/나란히 당도한/신의 방/너와 내가 만든/아름다운 완성/해와 달/지평선에 함께 떠 있는/땅 위에/제일 평화롭고/뜨거운 대답/‘’응‘.’”
문정희 시인의 ‘응’이란 시다. 살짝 야한 느낌도 있지만, ‘응’이라는 단어가 눈부시게 다가온다. 세상에 널린 온갖 터부와 편견과 왜곡을 깔끔하게 한 획으로 붓질하는 대답 ‘응’은 얼마나 뜨거운 말인가. 문자에서 ‘체위’를 발견하다니 그 밝은 눈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예술이, 시가 외설과 다른 것은 민소매와 배꼽티 차이라고나 할까. 이 시가 외설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은 ‘꽃처럼 피어난 나의 문자’라는 표현이 있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고 싶어’라는 말 앞에 진짜 중요한 말이 생략되는 건, 그 말을 앞으로 꺼내 말하기가 왠지 쑥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굳이 말로 집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오묘한 시가 탄생할 수 있다니 한글은 참 예쁘고 섹시하다.
시를 읽을 때, 나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나는 이런 단어에 끌리는구나, 이런 소재에 반응하는구나, 이런 문장에 마음을 내어주는구나…심신을 두드리는 시를 읽고 나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깨달음이 나를 향한 찬찬한 응시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늘 저 단어가 있었다. 저 단어가 내 인생에 단단한 매듭을 만들어주었다. 시를 읽어도 세월은 가고, 시를 읽지 않아도 세월은 간다. 그러나 시를 읽으며 세월을 보낸 사람에 비해 시를 읽지 않고 세월을 보낸 사람은 불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