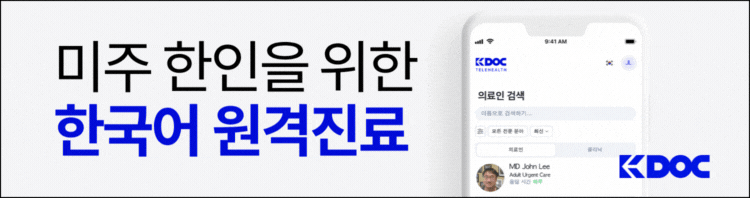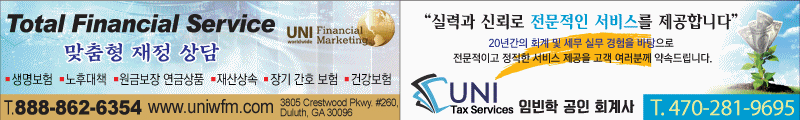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다모클레스의 검’은 영웅이 전장을 누비며 적과 싸울 때 쓰는 검이 아니다. 이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우아하게만 보이는 왕의 머리 위에 매달려 그 목숨을 위협하던 무서운 검이다. 이 검은 권력을 탐하는 자에 대한 통렬한 경고였다.
이탈리아 남부의 섬 시칠리아에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다. 이곳을 고대 그리스인이 점령하여 시라쿠사라는 도시국가를 이루었고, 나중에 로마에 정복될 때까지 큰 번영을 누렸다. 디오니시오스는 이 풍요로운 식민지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에게는 엄청난 세금이 들어왔으며, 궁전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왕과 그 일족은 매일 밤 연회를 즐기며 권세를 한껏 누렸다. 그 궁정에 다모클레스라는 시종이 있었다. 그는 왕의 비위를 잘 맞추는 신하로서, 늘 왕에게 입에 발린 말로 아첨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호화롭게 생활하는 왕을 질투하며 자기는 언제 저런 생활을 해보나 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모클레스는 평소처럼 왕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왕에게 입에 발린 말을 떠벌렸다. 왕은 듣다못해 다모클레스에게 말했다. “그대는 짐을 매일 칭송하는데, 왕이라는 자리가 그리도 좋게만 보이느냐?” 다모클레스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이를 말씀입니까? 왕보다 고귀하고 행복한 존재는 없으니까요.”그러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모클레스에게 말했다. “네 눈에 이 자리가 그렇게 좋게만 보인다니 어디 한 번 앉아 보아라.” 다모클레스는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뛸 듯이 기뻐하며 왕좌에 앉았다. “어떠냐. 왕좌에 앉은 기분이?” “더없이 행복하옵니다.”
왕은 딱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머리 위를 가리켰다. 그곳 천장에는 검 한 자루가 머리카락에 매달려 예리한 날 끝을 왕좌로 향한 채 번뜩이고 있었다. 다모클레스는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저 검이 어찌된 것이냐고 왕에게 물었다. 왕이 대답했다. “어떠냐? 왕이라는 자리가 겉으로는 좋게만 보여도 그 위에는 늘 이렇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검이 칼날을 세우고 있다. 그래도 그대는 여전히 아 자리가 부러우냐?” 오금이 저린 다모클레스는 즉시 왕좌에서 내려왔다. 그는 그때까지 품었던 왕에 대한 부러움이 싹 가셨다. 그리고 그 뒤로는 결코 권력을 탐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우화는 권력의 매력과 그 위험성을 풍자하고 있다. 다모클레스는 권려에 대한 욕망을 포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인간은 권력 앞에서 사족을 못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지 못해 안달이다. 권력은 사람의 뇌도 바꾼다. 권력이 있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당장 만나는 사람들부터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머리를 조아려가며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아무리 겸손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겸손하게 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그런 정도의 변화야 얼마든지 애교로도 봐줄 수 있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권력이 독선과 오만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다.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은 개코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권력감은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권력감은 도파민이라는 신경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뇌의 중독 중추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하위에 있는 개코원숭이는 지위가 올라갈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늘었다. 그럴수록 공격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쪽으로 변모했다. 로버트슨은 “권력이 강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 된다”며 “절대 권력의 속성을 생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으로 정의된다. 그러면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흥분시키는 것일까. “한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논리가 철저히 적용되는 것이 권력일까.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어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을 텐데 여전히 쳇바퀴 돌 듯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기적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억누르고 자제시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만 통제하는 수준. 이것이 현재 인류가 용인하는 오만과 교만이다.
우리는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잘나야 하고, 가진 것도 많아야 한다. 이것이 성공한 것이고, 살아가는 목표가 된다.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다. 교만과 오만을 부추기게 만든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 경계의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만과 교만을 억누르고 타인을 위한 배려가 더 힘을 얻을 때 사회는 좀 더 공동의 선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살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악이야 없으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니 선함이 악함보다 우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녕 ‘선한 권력’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한다. 겸손이 결핍된 권력은 대개 유리 권력화한다. 그만큼 쉽게 부서진다. 겸손하지 못한 권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지극히 겸손한 자였다. 그러나 권력의 맛을 알게되자 충성스런 신하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10년 넘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들었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 1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