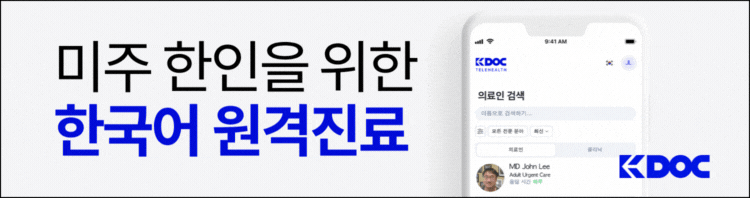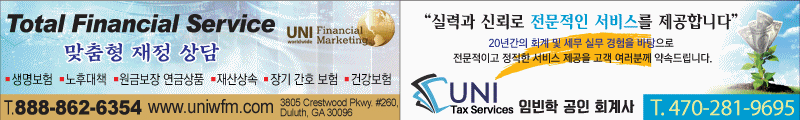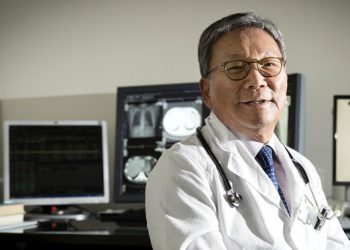싱그러운 나뭇잎이 초록빛을 맘껏 발산하는 더운 날이었다. 미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미는 나에게 병문안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H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 H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다.
미미는 동네 어르신들과 정답게 지낸다. 동네를 걷다가 문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부를 묻는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어떤 내용일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 익숙하지만, 미미는 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인다. 또 미미에게는 적극적인 다정함이 있다. 옆집 할아버지의 기운이 부쩍 약해진 것을 느끼고는 정성껏 호박죽을 쑤어 가져다 드렸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잊지 않고 찾아 뵈었다. 또 다른 이웃집에 평소보다 많은 차가 주차된 날, 그 풍경이 뜻하는 바를 알아채고는 이웃 할머니에게 서둘러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이번엔 미미의 다정함이 H를 향했다. 미미는 H의 지병과 수술한 부위를 고려하여 단백질이 많은 콩국물을 만들었다. 병실 분위기를 밝힐 오렌지 빛의 꽃 화분도 준비했다. 그런데 병원에 혼자 가기가 낯설다며 나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그렇지 않아도 나 역시 H를 찾아가 보려는 마음이 있던 터라 미미의 제안을 선뜻 받았다. 나는 뒤뜰에서 아직 살이 덜 오른 연두색 아삭이 고추 여남은 개를 급하게 거두었다. 아삭이 고추가 맵지 않으니 밍밍한 병원 식사를 할 때 H의 입맛을 돋우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H는 꽤 큰 수술을 받았는데도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치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병실 창가에는 다채로운 꽃다발들이 여러 화병에 꽂혀 죽 늘어서 있었다. 오랜 동안 H는 지역사회 다민족 연대를 위해 헌신해 왔다. H를 문병 온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 우리는 병실에서의 지루한 시간을 잠시나마 수다로 채웠다. 잡다한 얘기 가운데 H의 작은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아들은 사진과 영상을 다루는 작가이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현지인에게 그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현지인들이 기술을 습득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병문안 오기 전 막 읽기를 끝낸 소설 <빛과 멜로디>가 문득 떠올랐다. 주인공 권은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이다. 나는 권은과 H의 아들 이야기가 섞이면서 어느 이야기가 허구이고 실제인지 잠시 헷갈렸다. <빛과 멜로디>는 2024년 발간되었고, 지금도 전쟁 중인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은은 어둡고 살기 가득한 전쟁터를 다니며 사진을 찍는다. 전쟁터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 생명을 사진으로 보듬는다. 그에게 사진찍기는 연민 같은 감성팔이가 아니라 삶을 이어가도록 구체적인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이런 희망을 일찍이 열두 살의 권은은 경험했다. 부모가 떠나고 홀로 남아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죽기를 바라던 때였다. 그런 권은에게 같은 반 승준은 필름 카메라를 건넨다. 권은은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을 살게 하는 빛을 발견한다. 시간이 흘러 권은 자신도 사진 작가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맘 먹는다.
<빛과 멜로디>는 난민이 겪는 고난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이 책을 쓴 조해진 작가의 원작 <로기완을 보았다(2011)>가 작년에 영화 ‘로기완’으로 공개되었다. 이 영화는 탈북민 로기완이 벨기에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다. 처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영화라서 기억에 남아 있었다. 원작이 있는 영화인줄 <빛과 멜로디>를 만나고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 놓인 사람에게 공감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게 만든다. 권은에게는 카메라가 사랑이었고 빛이었다.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실의에 빠진 어느 난민을 살아가도록 빛으로 이끈다. 그 난민은 또 다른 난민과 그 빛을 나눈다. 오늘 나는 미미, H와 그의 아들에게서 빛의 조각들을 본다. 빛의 조각들은 어우러져 멜로디가 되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퍼져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