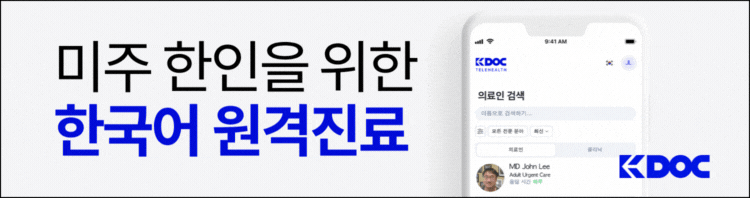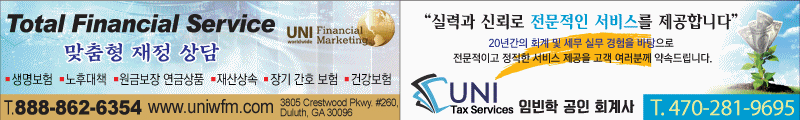만남은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상대에게 진심을 다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그 만남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다산 정약용과 황상의 만남이 그러하다. 다산과 황상의 만남은 험난한 유배지에서 이루어진, 인간적인 존중과 깊은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정리를 나누는 깊은 관계였다.
정조 서거 후, 몰아닥친 노론 벽파의 공격으로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다. 유배지 주민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 다산은 동구 밖 주막집에 자신을 의탁한다. 다산은 생계도 해결하고 유배의 무료함도 달랠 겸 주막집 한편에 서당을 열었다. 그때 시골 아전 자식들이 대부분인 학생들 중 유독 말수가 적고 명민한 소년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온다. 다산은 그 아이를 불러 공부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 소년은 대답 대신 쭈볏쭈볏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저 같은 아이도 공부할 수 있나요?” 이에 다산은 그 유명한 ‘삼근계(三勤戒)’를 들려준다. 너 같은 아이도 비록 속도는 늦을지라도 한번 문리를 터득하면 더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고, 또 너라야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며, 또 부지런하라.” 열다섯살 더벅머리 소년 황상, 그리고 마흔둘의 다산 정약용,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황상의 학문은 일취월장했다. 뿐만 아니라 스승 다산의 가르침을 평생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 오죽하면 항상 만지작거리던 삼근계가 너덜너덜해져서 다산의 아들 정약연이 다시 써줄 정도였다. 다산은 그를 유배 생활 중 얻은 자식처럼 여겼고, 황상 역시 스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삶의 지표로 삼았다. 책의 중요 부분을 베껴쓰는 초서를 강조한 스승의 뜻을 따라 일흔을 넘길 때까지 베껴 쓴 책이 자신의 키를 넘었고, 삼일장을 치르라는 아버지의 유언보다도 인간의 도리를 강조한 스승의 추상같은 호령에 두 달 시묘살이를 할 정도였다.
다산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복귀한 후 회혼일이 다가왔다. 황상은 깊은 산골에 틀어박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양 하늘을 바라보며 스승을 그리워했다. 다산도 마찬가지. 힘들던 유배시절 늘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 황상을 잊은 날이 없었다. 마침 스승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은 황상은 회혼연 잔치에 참석할 겸 상경을 결심한다. 교통수단이 지금 갖지 않던 시절, 전남 강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결코 함부로 마음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열흘을 넘게 걷고 또 걸어 마침내 황상은 다산의 집에 당도했다. 매서운 날씨에 열흘을 넘게 걷고, 길을 묻고 물은 끝에 해거름에야 겨우 스승집 대문에 당도했다. 하인이 나왔다. “뉘신지요?” “강진에서 선생님을 뵈러 왔네만.” 전갈이 들어가고 저만치 정학연이 마루를 내려서는 것이 보였다. “알아보시겠는지요? 산석입니다.” 정학연은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게 누군가! 이 무심한 사람아!” 두 사람은 고성사에서 한겨울을 함께 났었다. 함께 대둔산 유람을 다녀온 일도 있었다. 그때는 둘 다 파릇한 젊은이였다. 31년 전의 일이었다. “어찌 이제야 오는가? 아버님이 자넬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는가?”
방안에 들자 거기 환하게 형해만 남은 모습으로 스승이 계셨다. “제자 인사 올립니다.” 황상은 스승 앞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먹였다. 그렇게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이빨이 다 빠진 합죽해진 입으로 스승이 말했다. “그만 일어나거라.” “진즉에 뵈었어야 하는데, 이 길이 이리 멀었습니다. ”네가 이제야 왔구나. 나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여주려 왔구나. 잘 왔다. 많이 생각했더니라. 마재에 머무는 동안 황상은 스승을 위해 약탕관 역할까지 자청하며 수일을 극진히 모셨다. 다산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제자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답지 않게 삐뚤삐뚤 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부채 한 자루, 책 한 권, 중국제 먹과 붓 하나, 담뱃대 하나, 그리고 엽전 두 꿰미. 책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는 의미였고, 부채와 담배는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였다. 혹시라도 먼 길을 내려가다가 배를 곯을까,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도 스승은 여비까지 챙겨주었다.
황상은 이후 세 번을 더 상경한다. 그동안 황상의 시는 다산의 두 아들을 통해 한양의 문인들에게 소개되어 그 명성이 자자했다. 특히 추사는 제주에서 유배가 해배될 때 집으로 올라갈 마음이 급할 텐데도 강진으로 걸음을 옮겨 황상을 찾을 정도였다. 다산이 강진 18년 유배 기간 중 키운 제자는 수없이 많았다. 이들 중 끝까지 스승을 진심으로 한결 같이 섬긴 제자는 황상 한 사람 뿐이었다. 많은 제자들 중 거의 유일하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삶을 변화시켜 갔다. 사람의 만남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 만남과 인연은 스승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진다. 큰 나무 한 그루의 그늘이 이리도 넓다니…
더벅머리 소년이 스승이 내린 짧은 글 한 편에 고무되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가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화장실 주위만 돌아다니며 살게 되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노닐며 살게 된다. 문득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 입속에 맴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 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 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