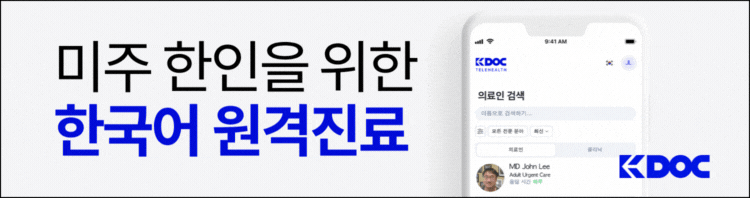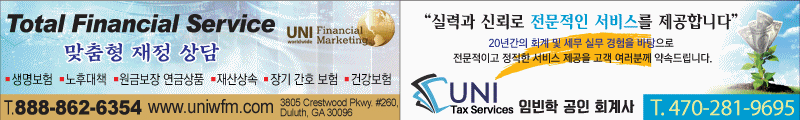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여전히 인간에게 경이와 경탄의 대상이다. 인간은 광대한 우주와 대자연의 신비를 온몸으로 직면할 때 오감을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의 경험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느낌을 받는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경탄과 경외로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내 안의 도덕률이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자 동경과 그리움의 대상이다. 어린 시절 마당의 평상에 누워 바라보던 밤하늘의 총총한 별을 생각해보라. 보석처럼 반짝이던 은하수 무리들, 이따금씩 밤하늘을 가르는 별똥별들, 이름도 모르는 별자리들을 세면서 밤을 새워 이야기하던 시절을, 그 시절의 동심은 배는 고팠어도 얼마나 맑았던가 별은 이 대지에 묶여 있는 우리 영혼에 상상의 나래를 달아준다. 별은 영원한 신화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불빛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한 ’시인이 있었다.
“별 하나에 추억과/별 하나에 사랑과/별 하나에 쓸쓸함과/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별 하나에 시와/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이다. 그는 또 ‘서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읊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괴로워했던 ’시인이었다. 누구나 하늘은 공경의 대상이며, 마음이 내재된 스케치북 같은 공간이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며, 어두운 밤으로 빠져들어가던 아련한 추억을 우리는 갖고 있다.
1977년 지구를 떠난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명왕성 궤도쯤에 다다랐을 때,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 돌려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았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지구를 가리켜 “우주에 떠있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라고 표현했다. 픽셀 하나보다도 더 작은 점으로 찍혀 있는 지구의 모습. 그 작은 섬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었다. 우주의 경이로움은 곧잘 허무함을 대동하고 찾아온다. 우주의 나이 137억년은 우리가 가늠하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다. 그 크기가 무한한지 유한한지조차도 확정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는 그저 광활하다고밖에 더 붙일 수사(修辭)가 없을 정도이다.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 우주의 경이로움 앞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왜소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는 바로 허무감이 찾아온다. “알고 보니 지구는 참으로 작고 참으로 연약한 세계이다. 지구는 좀 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존재인 것이다.”
알고 보면 우리 인류도 이 광막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내일 우리 전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 해도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달려와줄 존재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주의 입김 한 번에 오늘 지구가 날아가 버린다 해도 내일의 우주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가 작은 점이듯 인간이란 존재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한 것을.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조그만 행성 위에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는 우리 인류도 알고보면 우주 속에서 참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네 삶이라는 게 얼마나 찰나의 티끌 같은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결정한다. 별, 인간, 우주의 먼지뿐만 아니라 벌레까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피리가 부는 신비한 선율에 맞춰 우리 모두 춤출 뿐이다”라고 한 아인슈타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나는 미미한 태양계의 작은 부분 안에서도 한 조그만 행성 위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 일부이다. 우리가 우주를 사색하는 것은, 인간이란 우주 속에서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가를 깊이 자각하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확대 속에서 자아의 위치를 찾아내는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그것은 곧 나를 놓아버리고 나를 비우는 일일 것이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구는 얼마나 작고, 지구에 사는 나는 또 얼마나 작은가. ‘욕심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별빛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일상에 찌든 탓도 있지만, 도시의 하늘은 이미 별빛이 보이지 않는다. 낮시간 동안 생성된 갖가지 배기가스와 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별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현란한 불빛도 별빛을 가리는 요인이다. 태초부터 별은 우리 곁에서 환한 빛을 밝혀주었다. 영겁의 세월 속에서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을 보며 인간은 겸손을 배웠다. 때로는 기억해야 할 가치와 성찰을 별에 담기도 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는 한줄기 이상과 희망의 빛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빔하늘의 별보기를 잊어버리면서부터 현대인의 정신과 생활은 병들기 시작했다.
은하수를 본 적이 언제인가? 단순히 빛나는 것을 넘어 색과 형체를 가지고 천상을 가로지르는 그 빛의 무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은 지상에 고정되었고 머리 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꿈조차 꾸지 못하게 되었다. ’현대인이 하루에 단 몇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다. 이제 하늘 저편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가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 시선마저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별빛뿐 아니라 마음의 보석까지 잃게 될 것이다. 밤하늘의 별에는 무한이 있고, 영원이 있고, 찬란함이 있고, 불멸의 사랑이 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자. 우주를 생각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