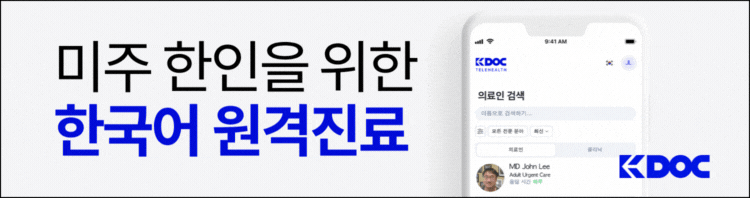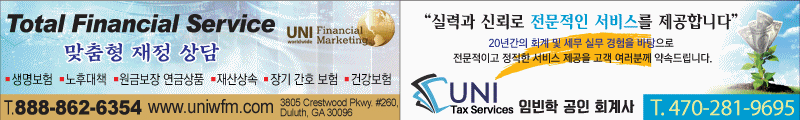제갈량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이는 단순히 그의 천재적인 지혜와 전략 때문만은 아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통해 한실 부흥이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니 결국 오장원에서 별빛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의 장엄한 최후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운명과 시대의 한계에 부딪힌 한 영웅의 비극적인 서사를 완성하며 감동을 준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아니다. 중원의 변방에 불과한 촉한의 재상이었고, 북벌을 하다 그마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촉한은 그가 죽은 후 오래지 않아 위나라에 정벌되고 말았다. 제갈량과 비슷한 수준의 일을 한 이는 중국 역사에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그는 삼국시대의 인물 중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차지해 많은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유비가 죽기 직전 어린 아들 유선을 탁고(유언으로 아들을 맏기는 것)하면서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갈량이 직접 황위를 취하라고 유언했을 때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 그의 충성심은 출사표에 잘 나타나 있다.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하며 후주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명문장이다.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瘁 死而後已)’는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후에야 그만둔다는 뜻으로 나라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다짐으로 제갈량의 삶을 한마디로 축약한 문장이다.
“선제께서 신의 미천한 신분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외람되게도 세 번이나 신의 누추한 초가를 찾아주시어 현실에 당면하여 해야 할 일들을 하문하셨습니다. 신은 너무도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를 위하여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선제께서는 운명하실 때 신에게 적을 토벌하여 한실을 부흥하라는 큰일을 당부하셨습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적을 토벌하여 한실을 부흥하는 공훈을 세우도록 맡겨주소서. 만일 한실 부흥의 공훈을 세우지 못할 경우,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선제의 영 앞에 고하소서. 신은 오늘 멀리 정벌의 길을 떠나면서 이 표를 쓰려니 눈물이 흐르고 울음이 북바쳐 무어라 아뢸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1392년 봄, 개경의 선죽교 위에서 한 남자가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 그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였다. 이방원과의 자리에서 서로 시조 한 수를 주고받던 장면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라는 노래를 읊은 뒤, 이방원이 보낸 자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 후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충절의 극치’ 즉, 나라와 임금에게 끝까지 충성을 지킨 상징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교과서나 전설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정몽주와 같은 시대에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무너져 가는 고려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달랐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이루려 했다. 반면 정도전은 더 이상 고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했다. 결국 정몽주는 새 왕조 건설에 반대하다 선죽교에서 목숨을 잃었고,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 설계자가 되었다. 그는 새 나라의 제도와 법을 만들고, 수도 한양의 도성 설계까지 맡았다. 조선의 기틀은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은 정도전을 역적으로 몰았고, 정몽주를 충신으로 높였다. 이 중심에는 태종 이방원이 있었다. 그는 왕위 싸움 끝에 조선의 왕이 된 뒤, 자신이 죽였던 정몽주를 최고 재상 자리인 영의정에 추증하고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자신이 죽인 이를 충신으로 기린 것이다. 반대로 권력 경쟁자였던 정도전은 역적으로 낙인찍혔다.
조선왕조는 왕조 개창에 반대한 정몽주를 왜 충신으로 만들었을까? 새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정몽주 같은 도덕적 모범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삼강행실도>라는 백성들의 도덕 교과서에 정몽주의 이야기를 넣었고, 문종은 그를 숭의전에 모셔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 사림들은 정몽주의 죽음을 단순한 충절의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도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희생’으로 받아들였다. 그에게서 ‘의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삶’을 배웠고, 정몽주는 조선 선비의 표상이 되었다. 그는 비록 조선 건국에 반대했지만, 조선의 유학자들은 그를 조선 성리학의 뿌리로 모셨다. 그로부터 이어진 학문과 정신이 조선의 지식과 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물질주의가 팽배하면서 ‘충절’이라는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 충절이 사라진 자리에는 너절한 배신과 탐욕이 난무한다. 그래서 충절은 그리움이다. 충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과 행복이 춤출 수 있다.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질곡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며 절규했던 윤동주 시인의 싯귀가 더욱 간절하게 다가온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